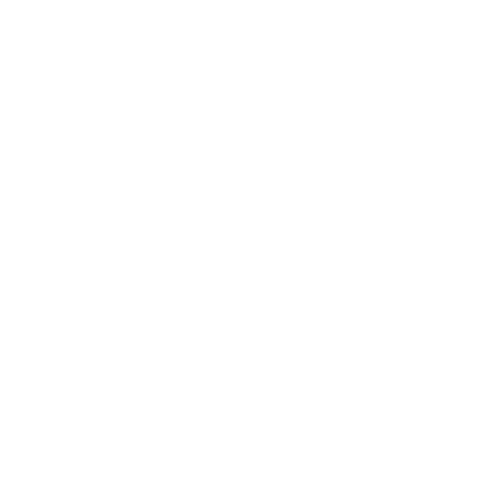
문승주작가
영아티스트
세공된 천사 새 사체에 대한 작업은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고고한 새가 어디서 죽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이 작업을 통해 생명과 죽음의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동시에 탐구하고자 한다. 새는 돌처럼 굳었지만, 그 모습은 유연한 형태를 보인다. 본인에겐 그 기괴하면서도 유연하게 꺾인 모습이 야릇하게도 인간의 살아있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잔인하게 뜯기고 으깨지며 짓눌린 형태가 세공된 듯 보였고 천사와 같이 보였다. 목판에 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무자비하고 무참한 상흔을 세공하듯 새긴다. 뜯겨 나간 살점의 흔적을 죽음의 과정을 복기하듯 다시 판을 뜯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또한, 무성 영화와 같이 절제된 흑과 백의 이분법적 대비로 색상에서 드러나는 자극을 줄여 죽음의 현장 속 잔혹함을 덜어내고 그 속에 포착한 천사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환기하고자 한다. 죽은 새를 화면에 옮길 때면 17세기 네덜란드의 바니타스 정물화가 떠오른다. 죽음을 그려 넣었지만 결국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 같고 돌아보게 된다. 중세에서의 죽음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항상 인간 근처에 있는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는 썩어가는 과정을 포착할 일이 없다. 박물관 속 박제와 같이 죽음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에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