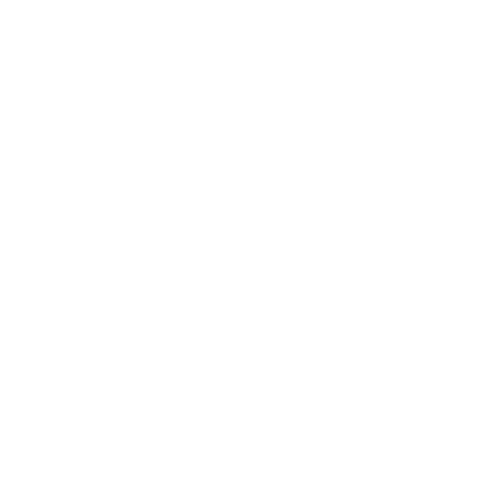
이소영작가
영아티스트
어린시절 나의 원초적인 고민은 ‘도예’라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질그릇 도(陶)와 재주 예(藝), 나에게 ‘도기의 예술’이란 공예 분야는 ‘생활’에서 피어났다는 측면에서 ‘쓸모’의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었다. 극도로 달련된 도공이 몇날 몇일 그릇을 만드는 것 만이 ‘도자기’를 배우는 사람이 나아가야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기도 했다. 나 스스로 정한 도자기의 정의는 그렇게 좁은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다. 도자기를 배우는 과정동안 배워왔던 것은 하나의 공식화 되어있는 과정들이었다. 물건을 만들고, 초벌, 유약을 바르고 또 재벌, 상황에 따라서는 삼벌까지, 그 과정에 맞는 ‘기술’과 ‘절차’를 배우며 무의식적인 수용이 따라오기도 한다. 왜 이 과정을 거쳐야되는지를 알기보다는 예부터 해왔던 과정을 무조건 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도자기라면 이래야지.’나에게 도자기는 그 자체로 편견이었다. ‘도자기라면 이래야지..’ 라는.. 그러다보니 한계가 다가오기도 했다. 보통의 도자기 공방에서 하는 도자기 수업의 의미를 납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가. 예술가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이 도자기 수업으로 이 사람들이 얻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도자기라는 분야에 메어있던 ‘한 사람’의 고민이였다. 나만의 답을 찾은 후부터 현재까지 한명의 ‘매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오고 있다. ‘흙’으로 만들어 구워내는 예술활동 뿐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활동을 시민과의 언어로 전환해보는 매개 활동이나, ‘예술’이 가지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기획 등.. 다양한 방식, 형식을 가진 실험을 해오고 있다. 예술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중기–중장기로 나눈 것은 아직 이러한 실험이 아직 ‘말기’에 닿지 않아서이다. 지금은 많은 방식과 형식을 고민하고 적용하고 또 고민해볼 시기일 것이다. 끝없이 고민하고 예술가로서, 매개자로서 ‘말기’까지 내가 해야하는 고민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실험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숙제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