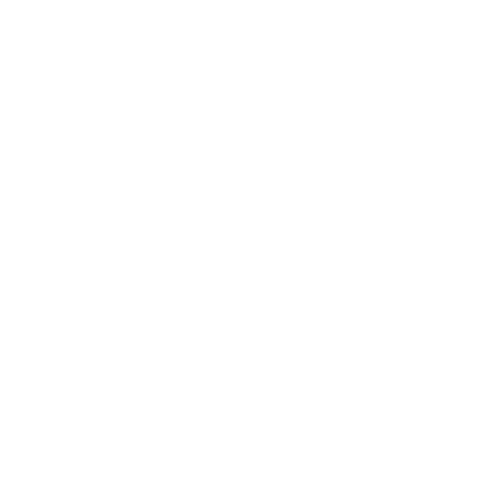
윤선홍 작가
히든아티스트
한국 화단에서 윤선홍은 지난 5년여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낸 몇 안 되는 작가다. 마치 화단과 거리를 둬왔던 삼십년 가까운 시간을 단박에 따라잡기라도 하겠다는 듯 엄청난 양의 작품을 쏟아내며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섰다. 장지(壯紙)에 분채(粉彩)라는 전통적 한국화 기법의 일관된 안정감을 바탕으로 조형 대상을 변주(變奏)하며 빠른 행보를 보여주었다. 나는 변주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작가의 주된 조형 대상이 꽃과 식물이기 때문이다. 한국화에는 물론 화조(花鳥)와 초충(草蟲) 그림의 전통이 있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그것은 친숙한 세계일 것이다. 그런데 윤선홍의 꽃과 식물은 전통 화조도나 초충도의 그것과 다르다. 경우에 따라 사실적 묘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화초(花草)는 사실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제는 작가의 미적 상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해바라기’컬렉션에서도 그 점은 두드러진다. 극사실 hyper-real에 가깝게 묘사된 해바라기 꽃은 오히려 실제 해바라기의 사실성을 해체하거나 실재성을 초월한다. 그에게 꽃과 식물은 일상의 오브제가 아니라, 일상 너머로 들어가는 촉발점으로 봐야 한다. 윤선홍의 세계는 따라서 그 조형 대상의 친숙함에도 일상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꽃과 식물은 일상적 구도 속에 있을 때조차 많은 경우 그 구도가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바깥으로 열림으로써 공간의 실재성에서 벗어난다. 안에 머물려 하지 않고 저 너머 어딘가로 가려는 것이다. 얼핏 정적(靜的)으로 보이는 그의 세계가 동적(動的) 에너지를 얻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따라서 그의 꽃과 식물이 좀 더 확장된 공간을 만나 어우러지는 경우에도 그의 세계는 풍경화로 바뀌지 않는다. 전통 산수(山水)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세계는 확산적이기 보다는 수렴 성향이 강하다. ‘해바라기’대작도 노랗게 들판을 가득 채운 공간의 유장함을 환기시키지 않고 지극히 작은 소우주로 수렴된다. 다시 기법에 대한 언급이 있겠지만, 해바라기 씨앗이 익어가는 지점에서도 장지에 분을 얹어 동그랗게 불거지도록 하지 않고, 후벼 파듯이 해서 안으로 색을 들이민다. 이성적이며 객관적인 과학의 표현이 아니라, 자궁과 같은 생명의 근원으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적 움직임에 가깝다. 그것을 퇴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존재의 안온함을 꿈꾸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조형 대상들은 환타지 동화 장르에서처럼 마치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는 작은 문과도 같다. 그래서일까? 윤선홍의 꽃과 식물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며, 크지 않고 소박하다. 홀로 자신을 뽐내며 드러내는 경우란 거의 없다. 해바라기 꽃의 경우도 앞서 말했듯 화려한 코스모스를 여는 게 아니라 꽃술과 씨앗의 작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수사학의 용어를 쓰자면, 은유(隱喩)적 상징이다. 공간과 구도가 마음의 조리개가 되어 어느 순간 찰칵 작가의 내면과 조형 대상인 꽃과 식물이 조응하며 생명의 기운으로 안온한 작은 우주가 열리는 것이다. 정물과 공간이 모두 의인화(擬人化)하는 이 순간이 바로 윤선홍의 미적 이상향으로서의 에피파니 epiphany다. 전통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장지에 스크래치나 상감(象嵌)을 쓰는 이유도 거기에 닿아 있을 것이다. 작가는 한지를 겹쳐 만든 두툼한 장지에다 안료인 분채를 여러 번 덧칠한 뒤 무늬를 파내거나 긁어내는 방식으로 밑색과 덧칠한 색이 만나는 미묘하며 다양한 어우러짐을 선보인다. 주로 여백 같은 넓은 면에 사용하는 그 기법은 일차적으로는 발색의 효과를 위한 것이지만 창작 심리학의 차원에서는 생의 고고학처럼 작가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며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때의 자아란 분열되기 이전의 원초적 통합적 자아일 것이다. 이처럼 스크래치와 상감의 파고듦은 그의 작품세계의 수렴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길에서 작가는 자신과 같은 작은 개인들을 만난다. 그의 꽃과 식물은 자신이자 동시에 수수하고 소박하며 평범한 주변 존재들이다. 그래서 화려하거나 두드러지지 않는다. 선인장이 웅장함을 과시하거나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는커녕 조용히 비켜서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화분들이 담백하며 질박한 토기로서 팽팽한 대칭을 이루지 않고 어느 한쪽이 허술하게 어색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모두 그 때문이다.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부족하고 분열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작가는 조형 대상인 정물의 의인화를 통해 하나씩 둘씩 그러모은다.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내세울 것은 없는, 아니 내세우지 않는 작은 존재들의 흥얼거림이 거기서 조금씩 일어난다. 윤선홍의 식물원이 그때 문을 연다. 꽃과 식물들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곳이 바로 작가 자신이 ‘어릴 적에’뛰놀던 잃어버린 낙원, 그래서 돌아가기를 꿈꾸는 이상향으로서의 상상 정원일 것이다. 거기서 작가는 색채를 올리고 내리며 전체를 조율한다. 사실 이번 전시에서 놀라운 점은 바다의 등장이다. 앞서 우리는 윤선홍의 공간이 풍경 landscape으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저 검은 섬들과 너른 바다는 무엇인가? 물론 그의 고향에서 열리는 전시가 작가의 유년의 바다를 호출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어릴 적에’그 바다가 내 마음의 식물원으로 수렴되지 않고, 그 공간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될까, 아니면 뭇 생명의 기원이자 세계의 자궁으로 다시 수렴될까, 나는 그 점이 궁금하다. 그의 세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어떤 변곡점에 서게 된 셈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윤선홍이 조성한 식물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공들여 그려낸 호젓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기서 설레는 손길처럼 환하게 우리를 맞이할 꽃과 식물들의 조용하지만 행복한 노래를 들어볼 일이다. 박철화 미술평론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