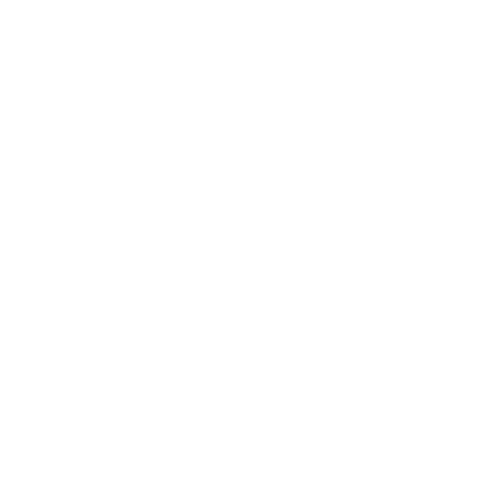
윤혜인작가
평면
나는 내가 살아온 세계 안에서 직면해야만 했던 경계에 저항한다. 이북에 계셨던 큰할아버지는 38선이라는 경계 너머의 존재로, 한국 전쟁 당시 홀로 이북으로 떨어지신 뒤로 그곳에서 외로이 여생을 마감하셨다. 이전까지 나는 큰할아버지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먼 존재라고 여겨왔고, 타의적인 판단에 기대어 분단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념해왔다. 그러다 언젠가 낡은 상자 속 그 분이 보내셨던 천에 적힌 편지를 발견하게 되던 날,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큰할아버지는 살갗에 닿는 너덜너덜한 섬유 조각을 통해 처음으로 나에게 실감되었다. 무뎌지고 잊혀졌던 '이산가족' 이라는 단어는 ‘천에 적힌 편지’라는 필연적 매개를 통해 나의 정체성에 온전히 각인되었다.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담고 있다. 경계 너머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물리적 경계에 가려져 자각하지 못했던 심리적 경계가 단절을 공고히 유지해 왔음을 스스로에게서부터 깨닫게 되었고, 경계에 대한 변화된 의식과 단절되어 왔던 관계의 회복을 작품에 상징화한다. 서로 다른 섬유 오라기가 만나 한 폭의 천이 생성됨은 처음으로 나와 존재가 겹쳐지고 엮어지는 최초의 관계에 관한 비자발적 인식을 투영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왔지만 피상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이북에 계신 큰할아버지와의 관계, 각종 미디어에서 비쳤던 이산가족을 향한 모호한 감정, 객관적인 역사적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DMZ라는 공간이 그 예이다. 섬유 조직을 최초의 오라기로 분해하고, 억겁의 겹을 재집적시켜 형상을 만들어가며, 균열을 통해 '틈'을 내는 과정은 존재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고를 흔적으로 남기는 의미이다. 예컨대 작가가 이북의 큰할아버지에게 느꼈던 공감과 연대, 우리 민족의 얼, 같은 언어와 문화를 나누고 같은 피가 흐른다는 사실처럼 경계가 나눌 수 없는 본질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다. '틈‘이 새겨진 순간,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DMZ는 '경계를 관통하여 산맥과 물줄기가 흐르는 불가분의 공간'으로 의식이 변화한다. 섬유에 형상화된 산맥과 물줄기의 ‘흐름’은 경계를 피상으로 만드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 경계의 단절성을 무효화하는 '수렴경계'라는 이름으로 확장된다. 이 작업들을 통해 각자가 경험했던 갈등과 오해로 비롯된 단절을 돌아보고 경험을 공유하며, 모든 존재를 나누는 경계가 하나로 수렴될 경계로 변화되어 공존하고 연대하기를 소망한다.
